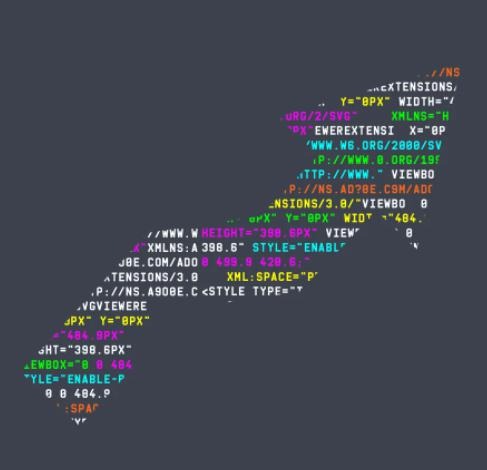티스토리 뷰

🌊 1. 2023년 바다, 사상 최악의 고수온 피해 발생
📌 피해 개요
- 피해금액: 약 1,430억 원,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 피해시기: 주로 2023년 여름부터 9월 하순까지 지속된 고수온 현상으로 발생
- 피해원인:
- 고수온 장기화
- 빈산소수괴 약화
- 폭염 영향
- 난류(따뜻한 바닷물) 유입 증가
📌 피해 대상
- 양식 어종: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전복, 굴 등
- 폐사 규모: 양식 어류 대량 폐사 → 어민 직접 피해
- 간접 영향: 가격 변동, 어민 생계 불안정, 연쇄적 지역 경제 타격
🔥 2.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심화
📈 수온 상승 폭
- 전 세계 평균 표층수온 상승: 1968년~2024년 사이 약 0.74도
- 우리나라 해역 상승 폭: 1.58도로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 동해 표층 수온 상승: 2.04도 → 가장 심각한 지역
- 원인: 대마난류 세력 강화 + 해수면 성층화 현상
📉 해수온 상승에 따른 변화
- 어종 분포 이동: 냉수성 어종 북상, 난류성 어종 증가
- 고수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 어류 면역력 저하 → 감염병 확산 가능성 증가
- 플랑크톤 감소로 먹이 사슬 붕괴 위험
🐟 3. 어업 생산량, 4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980년대 | 151만 톤 |
| 2020년대 | 91만 톤 |
| 2023년 | 84만 1천 톤 |
📌 냉수성 어종:
- 감소 → 명태, 살오징어, 대구 등 거의 사라지거나 생산량 급감
📌 난류성 어종: - 증가 → 전갱이, 삼치, 방어 등 따뜻한 해역에 서식하던 어종이 증가
📌 이 변화는 수산 자원의 재편을 의미하며, 전통적 어업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 4. 해양 생태계의 기초 생산성도 급감
📉 클로로필-a 농도 감소
- 해양에서 광합성 플랑크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2003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1.6% 감소
- 특히 서해, 동해 중부에서 급격히 낮아짐
📌 플랑크톤 감소는 → 어류의 먹이 부족 → 서식지 이동, 폐사,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지는 생태계 연쇄 붕괴를 유발합니다.
🧪 5. 빈산소수괴(저산소수괴) 현상까지 이상 징후
- 빈산소수괴: 해수 내 산소가 매우 적은 수괴로, 해양 생물의 호흡 불가
- 보통 여름철 고수온과 함께 나타나 생물 대피 또는 폐사 유발
- 그런데 2023년엔 이 빈산소수괴가 오히려 약화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
→ 이는 수온 상승 및 열 에너지 공급 구조의 변화 때문
📌 과거와는 다른 기후 패턴이 나타나며, 기존 해양 생태계 예측 모델이 무력해지는 조짐입니다.
⚠️ 6. 수과원의 경고와 향후 전망
국립수산과학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바다 생태계의 생산성이 급감하고 있으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다.”
“고수온 장기화에 따른 생물학적 영향은 물론, 새로운 해양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신규 양식 전략과 예찰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즉, 단순히 기후현상 수준이 아닌 국가 해양 전략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결론: 기후 위기는 바다에서 시작된다
이제 기후위기의 최전선은 **극지방이 아닌 바로 ‘우리 바다’**입니다.
계속되는 수온 상승, 먹이망 붕괴, 어종 이동, 어민 생계 파탄까지…
이는 단지 어업 문제를 넘어서 국가 먹거리 안보와 해양경제 붕괴를 예고합니다.
📢 지금 필요한 건?
✅ 지속적 해양 모니터링
✅ 신 어종 개발 및 양식 전환
✅ 국가 차원의 장기 해양기후 대응 정책 수립
반응형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에서 난리 난 ‘K-베이글’…줄 서서 먹는다고?!🍩 베이글로 한국 원정 오는 시대! (5) | 2025.04.27 |
|---|---|
| 🎶 작지만 깊은 이야기, 우쿨렐레의 기원과 숨겨진 의미 🌺 (1) | 2025.04.27 |
| 🎉 "서울 도심 속에서 승마 체험까지?!"영등포구, 5월 어린이 축제에서 최고의 체험을 즐기자! 🚀 (1) | 2025.04.26 |
| 🏘 “신혼부부가 4억짜리 아파트에 반값 전세로?! 과천시가 일을 냈다!” (5) | 2025.04.26 |
| 🧠“외동이 더 똑똑하고 정신도 건강하다고?” 놀라운 연구 결과 공개!😲 (1) | 2025.04.26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디지털 노마드
- skt해킹
- 저속노화
- 온라인 툴
- 초고령사회
- 기후위기대응
- 슬로에이징
- 생산성 도구
- 건강식단
- 미중무역전쟁
- 소상공인지원
- 청년지원금
- 웹 서비스
- 출산장려정책
- 전기이륜차지원
- 4시간봉
- python 데이터 분석
- 다자녀혜택
- 건강정보
- 트럼프관세폭탄
- 생성형AI
- 컨텐츠 생성
- 통신사보안
- 챗GPT
- 무역전쟁
- 당뇨예방
- 신혼부부혜택
- macd
- 치매예방
- 전기차지원금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